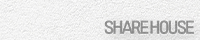자캐놀이 백업용
이웃집 배너 전체는 공지 게시글에 있어요
IN THE FOREST

Category : Text
[체스판] ♡
| 2023. 6. 5.
@_LINADO님 글입니다.
그냥, 오늘은 그런 날이었다. 사사로웠으나 사랑스러움이 가득한 감정이 가득하였으며, 기분은 기분대로 오묘했던 날이었다. 그리고, 계절은 계절대로 어느샌가 생명이 탄생하는 봄에서 생명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 여름이라는 계절로, 정확히는 일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초여름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한여름이라는 더욱 상세한 여름이라는 계절로 바뀜으로서 따사로운 햇살은 어느새 쨍쨍 내리쬐며 작열하는 태양로 변질 되었으며, 휘영청 달이 떠있는 밤의 시간은 줄어만 갔다. 밤의 시간이 줄어든 것은 슬펐지만, 겨울에는 밤의 시간이 늘어날테니 위안이 되었으므로. 나는 종종 그런 허황된 꿈을 꾸고는 했다. 너와 내가 서로를 갈망渴望하는 애틋한 사이가 되는, 그리고 서로에게 있어 사랑스러운 연인이 되어 함께 데이트를 하는 꿈을, 사랑스럽지만 이루어지기 어려운 꿈을 꾸고는 했다. 어째서 이루어지기 어려운지는 세상에 존재하는 그 누구보다 우리가 더 잘 알 것이다. 적어도, 우리의 사이는 그런 사이였으니까.
허나······. 우리는 우리니까, 우리라는 사슬로 엮여져 있었으므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지금 한 번 봐볼래? 우리는 지금, 서로가 부족하다는 갈증渴症을 느끼며 서로를 원하고 있으니까 말이다. 천천히 두 눈을 떴다. 눈을 뜨면, 사랑스러운 흑색의 머리카락을 가진 여성이 제 눈 앞에 누워있었다. 베티카 아이디스터, 그녀는 제 곁에 누워 고롱거리며 자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랑스러움을 자아냈다. 그녀가 자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녀를 지켜주고 싶게 만드는 욕구를 자아냈다. 레슬리 에피넷은 베티카를 바라보기만 하다, 못 참겠는지 그녀의 푸른색 옆머리를 귀 뒤로 넘겨주었다. 걸리적거려보이기도 했고, 그리고······ 스킨쉽이라도 하고 싶었으니까 말이다. 레슬리가 베티카의 옆머리를 귀 뒤로 넘겨주었을 때에, 베티카는 우웅, 하는 소리를 내는 듯 싶더니 두 눈을 천천히 떴다. 이윽고 베티카는, 퍽 비몽사몽한 표정으로 레슬리에게 왜 이렇게 이른 시각부터 일어났는지, 그리고 또 자신을 왜 이렇게 이른 시각에 일찍 깨우느냐. 라는 뜻이 가득 담긴 듯한 눈빛으로 레슬리를 바라보았다. 레슬리는 베티카를 한 번 보더니, 하하. 하고 낮게 웃어보였다. 적어도, 레슬리는 자신의 고의로 곤히 자고 있던 베티카를 깨우거나, 혹여는 잠에서 뒤척이게 한다던가, 그럴 생각은 없었으므로 말이다······.
"그래, 뭐. 아직 아홉시도 안 되었잖아. 아니, 이게 문제가 아니라······ 휴일인데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난 거야? 바보 같이."
"그냥 눈이 일찍 떠졌어. 베티카, 너와 함께 맞이하는 휴일이라 그런 걸지도 모르겠지만."
베티카는 고양이 같은 눈매를 휘어 접어 한 번 웃어 보였다. 이윽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원래의 눈으로 돌아왔지만 말이다. 레슬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가븨얍게 옷을 챙겨 입었으며, 베티카에게도 입을 옷을 주섬거리며 건네주는 것은 덤이었을지도 모른다. 레슬리는 물론이요, 베티카 또한 레슬리가 건네준 옷을 입고 난 후에 아직은 잠에 취한 듯, 조금 잠긴 목소리로 무어라 말을 했지만······ 글쎄. 그 말은 몹시나 작았던 나머지, 레슬리는 미처 듣지 못했다.
오늘은 레슬리와 베티카가 연애를 시작한지 꽤 된 날이었으며, 그리고 데이트를 하기로 한 날이었다. 다른 커플들처럼 함께 밥을 먹고, 그리고 함께 카페에 가서 달콤한 것을 먹기도 하고, 스티커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에 가서 잘 어울리는 포즈를 취하며 사진을 찍기도 하고, 영화도 보고, 그리고 또······. 하고 싶은 것은 무수히 많았지마는, 하루는 24시간이다. 즉, 하루는 24시간으로 정해져 있었다. 그리고, 곧 12시가 되어가니 함께 데이트를 할 수 있는 시간 또한 12시간이 채 남지 않은 것이라는 생각에 레슬리는 베티카의 손을 꼬옥 붙잡아 손깍지를 낀 채로, 현관을 나서 집에서 가장 근처의 카페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뭐 먹을 거야?"
근처의 카페에 도착한 뒤에, 베티카가 담담한 어조로 레슬리에게 물었다. 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라고 작게 덧뭍인 베티카는 얌전히 레슬리를 기다렸다. 아니, 얌전히까지는 아니었던가? 잘은 모르겠지만, 베티카는 자신의 기준에서는 그랬으므로 이건 그냥 넘기도록 하자. 레슬리는 평소에 자주 시켜 먹던 음료와 베티카의 연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한 뒤, 베티카가 기다리고 있는 테이블로 발걸음을 옮겼다.
"많이 기다렸어?", "뭐, 아마도. 그래도 빨리 왔으니 봐줄게." 레슬리와 베티카 사이에서는 둘의 일상 대화가 오고 간 후, 레슬리는 베티카를 바라보는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졌다. 아, 베티카는 오늘도 사랑스럽구나. 레슬리는 그렇게 생각하며 베티카를 빠안히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다. 레슬리는 베티카를 보고, 베티카는 부끄러운지 시선을 피했을 뿐이었다.
지잉, 징- 하는 진동이 느껴짐과 동시에 테이블 위에 있던 진동벨이 시끄럽게 울리기 시작했다. 레슬리는 베티카에게 "음료 찾아올테니 기다려줘."라고 말한 후, 다소 빠른 발걸음을 옮기었다. 주문한 음료를 들고 테이블로 돌아온 레슬리는, 베티카에게 연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건네주었다.
"있잖아, 베티카. 그러니까··· 우리, 카페에서 데이트 하는 건 오랜만인 것 같지 않아?"
"그렇지 뭐, 그동안은 레스토랑 같은 곳만 같었지. 아니면 놀 수 있는 곳이라거나, 홈데이트였으니까."
둘은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듯 작게 미소를 짓기도 했으며, 어떤 이야기에는 베티카가 약간 당황하여 말을 더듬기도 했으며, 어떤 이야기에서는 레슬리가 도르륵, 하고 눈을 굴릴 뿐이었다. 그 이야기들은 레슬리와 베티카의 어릴적 추억부터 시작하여 지금 당장까지의 추억까지도 꾹꾹 눌러담긴 이야기였다고 볼 수도 있었다. 레슬리 쪽이 먼저 음료를 다 비우고 베티카를 바라보자, 베티카는 남아있던 연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조금은 빠른 속도로 마셨다. 이윽고는 다 마신 음료를 놓는 곳에 놓고, 레슬리와 손을 꼬옥 붙잡은 채로 카페 밖으로 나와 걷기 시작했다. 카페에 얼마 있지 않았던 것 같았는데, 밖은 어느새 쨍쨍한 햇살 대신에 영롱한 달빛이 은은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그리고, 레슬리는 베티카보다 몇 발자국 앞에서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뒤를 돌아 베티카를 바라보았다. 그의 뒤에 내리는 달빛은 베티카를 눈부시게 만들었다. ···잠시만. 원래 달빛이 눈부시던가? 그리고 베티카의 귓가에는 레슬리의 조곤조곤하고도 부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베티카, 이제는 눈을 떠."
베티카는 상체를 일으켰다. 어두캄캄한 방 안, 그리고 침대 위에서 두 눈을 뜬 베티카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설마 이 모든 것은 자신의 감정에서 비롯된 꿈이었느냐, 라고.
사랑스러운 검은빛의 머리카락을 지니고 있던 여성은 지끈거려오는 이마를 짚었다. 아, 내가 얼마나 레슬리를 그리워했으면. 내가 얼마나······. 그가 꾼 꿈은 한 여름밤의 사랑스러웠으나 존재할 수 없는, 그런 허황된 꿈을 꾸었다. 이제는 존재할 수 없었기에 아련하고 외로옵는 꿈을 꾸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 환상적인 꿈이었으나,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기에 어렴풋이 슬픔이 느껴지는 것도 같다고··· 그렇게 생각했다.